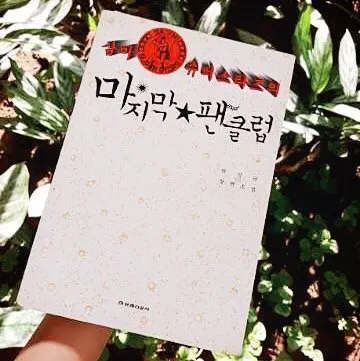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by 박민규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라리아와 각종 풍토병이 만연하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이상하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던 바로 그 해에, 대한민국의 야구는 프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각 지역에 연고를 둔 다섯 개의 구단들이, 곰, 호랑이, 용, 거인, 독수리 를 팀 마스코트로 내세울 때, 인천 연고의 ‘삼미’는 클립턴 행성의 바로 그, 우리 모두의 수퍼히어로 ‘슈퍼맨’을 상징하는 로고를 앞세우며, ‘삼미 슈퍼스타즈’라는 이름의 프로야구팀을 창단한다. 이 소설은 바로 그해, 프로야구가 시작된 1982년 인천에서 곧 중학교로 입학할 12살 소년인 내가, 삼미의 어린이 팬클럽 회원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SNS의 수만 보더라도 한 손에 다 꼽기 어려울 정도이고, 온라인 상에 나 있는 각종 채널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의 사회활동도 가능한 요즘이지만, ‘신문’과 ‘방송’이라는 양갈래 산맥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때로는 편파적인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는 한가지, 예를 들어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 하나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그것에 접근 가능케 하는 미디어로, 그야말로 ‘전 국민’이 몰려들 때가 있었다. 그때가 바로 야구의 프로화가 되는 그 시기였고, ‘나’와 친구 ‘조성훈’ 같은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아버지와 그 친구들, 동네 반장님과 구멍가게 아저씨까지 그들이 속한 지역을 대표하는 팀을 ‘종교’처럼 믿고 열광하는, 1982년은 바로 그런 시대였다.
그렇지만 삼미는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팀 창단 이래 최악의 기록들만 역사에 남긴 채, 프로야구 출범 3년 만인 1985년에 팀은 해체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삼미의 부진과, 연이은 삼미 팬들의 변심과 꼴찌팀의 팬클럽 회원인 자신들에 대한 조롱으로 상처 입은 15살의 나는, 그것을 소속의 문제로 결론 짓는다.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세상은 모두에게 프로이기를 강요했다.우린 프로라구! 프로가 그러면 안되지! 프로답지 못하군! 등등, 누가 정해놓은지도 모르는 한계선을 향해 뛰어 오르며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뛰어 가기를 요구했고, 그 한계선을 향해 뛰어가다 각자의 한계에 부딪쳐 멈추는 사람들에게 ‘낙오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속한 그룹에서 제외시켰다. 어느 새 사람들은, 소속에 따라 평가받고, 소속에 따라 각자의 출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 소설은 야구 이야기가 아니었다.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운을 때고는 시종일관 ‘나’와 친구 ‘조성훈’, 그리고, 고교동창 조부장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생의 초반에 야구 에게로부터, 삼미 에게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패배감은 나로 하여금 소속에 대한, 계급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든다. 썩어 들어가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젊은 피로써 목도만 하지 못하고 각종 청년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 서적들을 독파 하다가도 문득 깨닫는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들도 모두 일류대 ‘소속’이었다......
일류대에 들어갔고, 일류들과 나란히 졸업할 만큼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찾아온 ‘청춘’을 살았다. 일류 회사에 취직을 했고, 결혼을 하고, 그 프로의 대열에 서서 더 나은계급으로 가기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곳의 계급의 층위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MF의 칼바람이 불던 그해에 나는 이혼을 했고, 회사에서는 또다른 층위의 계급으로부터 해고 당했다.
프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구름같이 떠났던 조성훈이 또다시 구름처럼 돌아와서 내게 말한다. “너도 어느순간 프로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내 시간을, 내 삶을 살라고 이야기 해준다. 그리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결성한다. 힘든 볼은 굳이 잡지 않고 어려운 투구는 굳이 치지 않는 것이 목표인 야구팀. 볼을 잡으러 갔다가도 아름다운 민들레가 있으면 그 꽃을 감상하는 쪽을 택하라는 야구클럽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힘을 쓰고 정신을 쏟았는지 이야기 한다. ‘노히트’ ‘노런’을 기록해도 아무도 죽지 않으며, 그 누가 병살타를 쳐도 욕은 좀 먹을지 모르지만 때려죽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다 만신창이가 되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결국은 ‘돌연사로 죽고 말 것 같은’, ‘너무 열심히 살기만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송가 와도 같은 작품이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라든지, 지금을 즐겨... 라든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값지다... 라는 등등의 말은 지금껏 수없이 듣고 읽고 쓰고 살아왔지만, 어쩐지 그 모든 말들은 ‘인천 앞바다에 뜬 사이다병’처럼 둥실둥실 떠 다니기만 한 것들 이었다면,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에서의, ‘프로’, ‘삼미’, ‘나’, 그리고 ‘조성훈’의 이야기와 삶은,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며 ‘아마추어’로 남지 못하고 진정한 야구를 버린 ‘프로야구’라는 배경화면에, 마치 ‘결국에는 삼천포로 빠져버린’ 내가 왜 그리 되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의 파노라마같이 다가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득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
나는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책을 읽으며 피식피식 웃는 것은 기본이고, 박장대소를 터뜨리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특히 초반부의 작가가 선사하는 블랙코미디들은,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본 개그 프로그램의 백 배는 더 재미있다. 웃다보면 금방 페이지가 나아가는... 그리고 작가의 필력, 물론 이승우 작가나 윤대녕 작가가 가지는 깊이와 무게는 없다. 천명관 작가가 가지는 대단한 이야기성도 없다. 그렇지만 상념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작가적 페이소스는 남다르다. 그리고 문장들은 살아서 숨을 쉰다. 야구를 통해, 프로만이 살아남는다는 현실의 냉혹함을 절감한 16살의 소년이, 막 잡힌 생선이 갑판 위에서 펄떡이듯, 잠못 이루는 밤의 한가운데에서 펄떡인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16살의 고뇌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구만리같은 소년의 정서가 혹한의 날씨에 뺨을 스치는 칼바람으로 다가온다. ....
회사생활만 줄기차게 하다, 사업에만 죽어라고 내 몸을 혹사 시키다가, 결국에는 돌연사로 죽고 말 것 같은, 쉴 새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