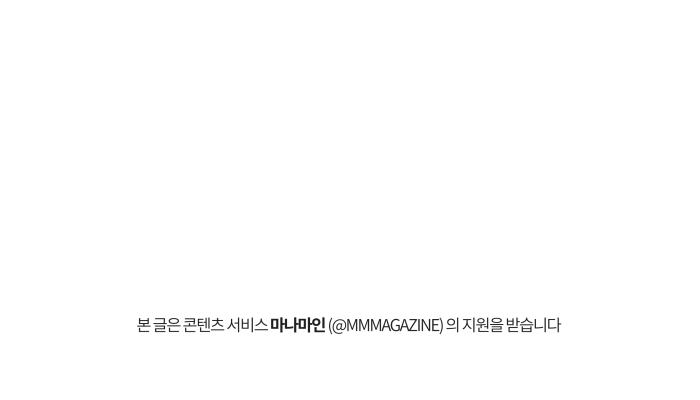요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 제가 몇 가지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차량호출 서비스가 왜 중요한가. 어찌보면 콜택시를 앱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 키워드는 ACES로 요약됨. 자율주행(Autonomous), 초연결(Connectivity), 전기차(Electicity), 공유(Sharing)임.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유가 꼽힘. 그 이유는 이 모든 키워드의 경로를 승차공유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고, 미래 모든 기술이 대중화된 시점에 서비스의 이용 관문이 '차량호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로를 승차공유 서비스가 제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현 시점에 모빌리티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은 라이드쉐어링과 친환경차 부문임. 테슬라, 비야디(BYD) 등의 전기차 업체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친환경차 부문은 향후 10년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시장이지만, 그 이후엔 본격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임. 모빌리티 서비스란 ACES의 모든 키워드가 상용화되면 시장의 판도가 차량 제조업체 위주에서 '이동 서비스 제공업체'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함.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해 9월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것임.
승차공유 업체들이 구축한 플랫폼은 ACES(자율주행초연결공유전기차)가 대중화된 시기에 소비자와 시장이 만나는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인정 받고 있음. 우버(130조원), 디디추싱(90조원), 그랩(20조원), 리프트(18조원) 올라(7조원) 등임. 무엇보다 승차공유 기업들을 정점으로 완성차 제조업체, 자율주행 기술업체 등이 합종연횡하고 있음. 우버에는 도요타, 볼보, 타타 등이 투자 혹은 공동투자 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음. 현대차는 그랩에 투자함. 우버와 디디 등 플랫폼 업체들은 유치한 투자금으로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쏟고 있음.
승차공유 시장의 거대한 세 가지 흐름.
1)소프트뱅크가 건설한 라이드쉐어링 제국
소프트뱅크는 우버의 최대주주이면서 디디추싱과 그랩, 올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임. 이런 영향력으로 각국 시장의 교통정리(우버 차이나를 디디에 매각), 자율주행 기술업체들과의 연합군 형성 등을 이끌고 있음.
2)100년 라이벌인 다임러와 BMW의 합작사 신설
독일의 대표 자동차 업체이자 라이벌인 다임러벤츠와 BMW는 자사들의 차세대 모빌리티 자회사들을 다 묶어서 합작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2018년 3월에 발표했고, 이번달 22일 10억 유로를 공동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힘. 두 회사는 마이택시(택시호출앱), 카투고(라이드쉐어링), 드라이브나우(라이드쉐어링), 파크나우(주차중계앱), 무블(차량호출앱), 충전시설 등을 운영하던 모빌리티 자회사들을 묶을 예정. 여기서도 핵심은 승차공유임.
3)자율주행 선도업체 웨이모의 카풀앱 웨이즈 서비스 확대
자율주행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기업가치가 180조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음. 웨이모는 웨이즈라는 내비게이션 업체를 인수해 자체적으로 웨이즈카풀이란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를 출시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함. 1.6km당 54센트에 불과한 저렴한 요금을 책정함.
-승차공유 서비스는 왜 국내에 도입하기 어려운가.
=승차 공유 서비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택시산업과 충돌하긴 했으나, 한국에선 그 정도가 더 심함. 국내 택시 숫자가 세계 어떤 대도시보다 많은 상황. 2013년 통계로 보면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는 서울이 6.77대, 런던 3.31대, 뉴욕 1.58대, 파리 1.26대임.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소득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택시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택시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면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만든 중요한 두 가지 변화는 1) 플랫폼 최적화, 2) 기사 공급 확대임. 우버는 자가용 운전자를 플랫폼의 서비스 공급자로 끌어들여 이동서비스 수요자와 매칭시켜 줬음. 일반 자가용 운전자를 이동서비스의 공급자로 끌어들인 것이 2) 기사 공급 확대이고, 각 지역의 이동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절히 매칭시켜 준 것이 1) 플랫폼 최적화임. 국내에선 현재 고급택시(카카오블랙, 타다 프리미엄), 11인승 이상(타다, 벅시), 카풀(풀러스)을 제외하곤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택시업계의 극한 반대로 2) 기사 공급 확대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에 올려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고, 지불용의가 기존보다 높은 고급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신규로 공급하는 1) 플랫폼 최적화는 가능함. 이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택시의 공급을 유도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서비스 평가와 피드백이 활성화되어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짐. 궁극적으로 택시가 자가 차량 운행, 대리기사 등의 수요를 흡수해 현재 3%에 불과한 여객수송분담율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