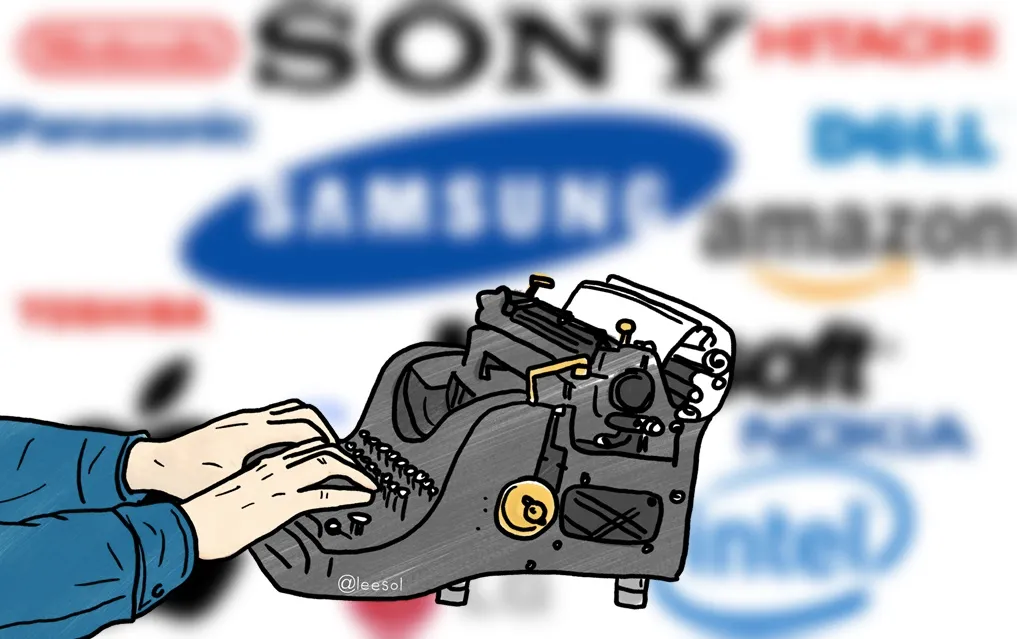
결혼할 때 선배가 써 준 사내 게시용 결혼신문 기사는 '그리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기자들 끼리의 연애사는 늘 그렇듯 경찰서에서 시작되곤 한다' 정도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기자이면서 기자와 결혼했다. 기자끼리의 연애담, 결혼생활 이야기를 포스팅하자면 내용은 수십 편짜리 연재를 할 만큼이 되지만, 아직 아내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오늘은 그냥 개별 기자로서 두 사람의 성향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적어보려고 한다.
나는 특별히 기획기사가 있지 않는 한 내일 준비는 내일 하는 편이다. 물론 내일 일정이 뭐가 있고 어떤 기사를 발제해야 할지를 대강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늘 미리 노트북 앞에 앉아서 미리 일정을 정리한다거나 발제문을 적어 놓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내는 내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퇴근하지 않는다. 회사 특성 상 일정은 전날 보고해야 하지만 성향부터가 그렇다.
나의 경우 장점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점일 것이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닥쳐서 고민하고 시작해도 대체로 마감은 되니까. 미리 고민하고 걱정한 것들이 열개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다가오는 건 다섯개 밖에 안 될 때도 많다. 그럼 쓸 데 없이 걱정한 게 아깝지 않나.
그래서 아내는 나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다.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한다. 내일 출근해서 일할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전망'류 기사를 잘 못 쓰고 한 사안이 터졌을 때 판을 벌이는 걸 잘 못한다. 스트레이트 외에 박스기사들을 여러 꼭지 발제하는 기획안 짜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내는 잘 한다. 더군다나 요즘 인사가 꼬여서 팀장 없이 혼자 하니까 연습이 돼서 더 잘하는 것 같다.
기사를 쓸 때도 나는 취재만 다 되면 한 번에 확 써버리고 치운다. 군대에서 맞으면서 독수리타법을 면한 느린 손으로도 30~40분 만에 원고지 8~10매를 호로록 써버리기도 한다. 아내는 문장, 토씨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한다. 손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빨리 쓰지 않는다. 빨리 써야 하는 회사에서는 단점일 수 있다.
나는 기사를 쓰고 전화를 많이 받는다. 자잘하게 틀리는 것도 있고, 미묘한 뉘앙스가 누군가에게 거슬리는 경우도 많다. 기사를 잘 못 쓰는거다. 아내에게는 그런 전화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원자료가 틀리지 않은 이상 자잘한 오류도 본 적이 없다.
기사가 나가고 난 뒤 미련을 안 갖는 건 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만 기왕 물을 엎어 버린 거 후회하지 않는다. 좀 더 잘 썼을 수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그랬던 거 할 수 없지 머' 하고 넘어간다. 합리적인 핑계 뒤에 숨는 거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
아내는 반대다. 이미 나간 기사 갖고도 계속 곱씹으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한다. 아이템을 캐치해서 취재를 하다가 안돼서 접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나처럼 잊어버리지 못한다. 건강에 안 좋다. 이 짓 오래 하려면 나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기사에 댓글을 안 본다. 원체 많이 달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직접 해명 답글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플 단 놈에게 현피를 신청할 수도 없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대로 맞고만 있어야 하는데 굳이 보고 속상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한다.
아내는 종종 댓글을 다 읽는다. 아내 기사엔, 아내 회사 기사엔 댓글이 많이 달린다. 그만큼 욕도 많고 선비질 하는 인간도, 앞 뒤 사정도 모른 채 무작정 악플 달고 기레기 어쩌구 하는 뭐하는 인간인지 궁금한 부류도 많다. 아내는 그런 걸 굳이 보고 상처 받고 얼마간을 우울해 하기도 한다. 나는 아내 기사에 달린 악플을 신고한 적이 있다.
비슷한 점도 있긴 하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자기 기사 거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민망하기도 하고 기사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자랑할 만한 기사에 관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비슷한 이유에서 기사만 썼다 하면 페북에 올리고 그러는 기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특종보다는 한 사람을 울리는 기사를 쓰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도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은 안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