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닮은 사진
여름엔 비 오는 날이 더 덥지만, 역시 가을이 되니 비 오는 날도 제법 괜찮다. 문제는 잠도 안 오고,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것인데...
하루 중 시간대와 상관 없이, 일단 글을 써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뭘 써야할지에 대한 생각이 확실한 편이다. 당장 생각나는 것이 소재가 된다.
골똘히 생각한 것보다는 찰나에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말이 찰나의 생각이지 포스팅을 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언젠가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난 일기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에 약간의 괴로움이 따를 때이다. 억지로 하나 골라서 쓸 수는 있겠으나, 그 무엇도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때가 가끔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The Full Motley]라는 제목으로 기록해두려고 한다. 뭘 기록할 것인가? 많이 쓰고 싶은 글, 약간 쓰고 싶은 글, 쓰려고 계획한 글, 쓸지도 모르는 글, 그냥 지금 막 떠오르는 소재, 등등. 사실 어느 하나가 먼저 치고 나오지 않아서이지, 보글보글하고는 있으니까.
[The Full Motley] 시리즈는 (자주 연재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내게 일종의 '노트'가 될 것이고, 읽는 분들 입장에선 일종의 '편성표'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나올 얘기들이니까 말이다. 제목의 뜻은 '알록달록한 의상(또는 비슷한 것)'을 뜻하는 아주 옛날식 표현인데, 언뜻 보면 비슷한 영화 제목도 있어서 이렇게 정해봤다.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제목이니까, 부제로 '포스팅을 위한 잡다한 노트'를 항상 덧붙일 생각이다.
어쨌든, 여러 글이 동시에 쏟아져나올 수 없어서 보글거리는 이 상태를 설명하자면...전에 썼던 표현으로, 먹이를 달라는 아기새 중에서 먹이를 먼저 넣어줄 놈을 찾지 못하는 느낌이다. 한 놈이라도 좀 더 돌출되거나, 입을 더 크게 벌린다거나 한다면 좋겠는데.

어느 놈에게 먼저 먹이를 줘야할까.
오늘따라 잠도 안 오고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는데, 커피도 마시지 않은 이 날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대문 대신 쓴 사진이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닮았다면, Earth Wind & Fire의 다음 노래도 그러하다. 제각기 눈에 띄는 현란한 의상을 입고 부기를 추는 글 소재들...
현재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닮은 공연그렇다고 부기랜드를 들으면 더 심란해지니, 이런 날씨에 자주 듣는 스탠더드를 듣고 있다. 가수로서 호불호나 평가는 많이 갈리는 듯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성 보컬 중에서 제일 시원, 화끈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에타 제임스(Etta James)가 부른 Stormy Weather.
이 버젼은 한 10년 전쯤 나온 영화 A Single Man에서도 사용되었다. 결국 [Jem TV]에서 이 영화를 반드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떠올랐으니 일단 대문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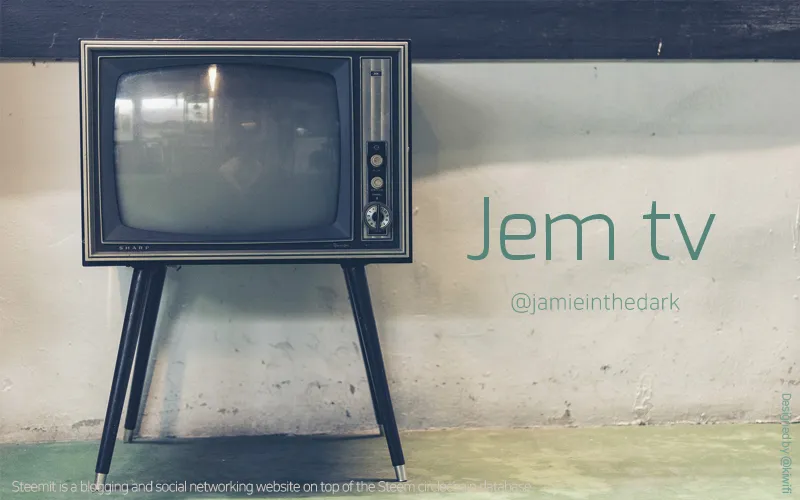
영화, TV영화, 드라마 등을 다루는 연재글 [Jem TV]의 대문
영화 A Single Man의 특이점은 디자이너 톰 포드(Tom Ford)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것이고, 내용은 동성 연인을 잃고 자살을 결심한 한 남자(콜린 퍼스)의 이야기이다.

혹시 이 영화에 대해 쓰게 된다면 언급하겠지만, 포스터의 콜린 퍼스처럼 저렇게 눈을 내리까는 표현은 아주 예전부터 동성애자 캐릭터임을 암시하기 위해 쓰였다. 물론 이 포스터에서도 똑같은 의도로 그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습(?)적 설정이 있었다고 한다.
가령, 유명 작곡가 콜 포터(Cole Porter)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Night and Day에서도, 캐리 그랜트가 부인과 재회하면서 눈을 저렇게 내리까는 장면을 길게 보여준다.

딱 요 장면은 아니지만, 눈을 내리깐 장면. Night and Day 中
그때마다 대문을 달리 쓰고 있는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에 올릴 내용도 있다. 제일 최근 회차에서 언급한 인물도 물론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어릴 때의 친구가 있어서, 그 애에 대해서도 역시 언젠가는 써보려고 한다.

보통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시리즈에 잘 쓰는 류는 아니지만, 기억에 대한 글을 예고하는 사진
집에서 키워준(또는 키워주지 못한) 자존감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완성되는지(혹은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10대 시절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의 근원을 찾고 싶을 때 10대 당시를 떠올리는데, 내 경우는 착한 여자아이들을 떠나서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발탁(?)되었다가 결국 걔네를 떠났다. 그 경위에 대해서도 지난 일기를 비롯해서 몇 번 간접적으로 언급했었지.
암튼, 그래서 내 10대 시절 중에는 여자아이와 친했던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명제에 동의, 부동의할 정도로 걔들을 충분히 겪어보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하다. 게다가 입학 초기에 분명 괜찮은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그냥 '강한' 무리에 들어갔을 뿐이다. 어차피 백인 중산층의 학교라 크게 사고치거나 애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는 없었지만, 충분히 10대 특유의 치기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무리였다. 그때, 처음부터 아예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은 해본다. 물론 걔들을 떠나면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 사소한 시비는 서로 종종 걸었지만.
학교에서는 여러 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다녔는데, 그래도 반 출석을 부르는 담임이 있었고 전용 교실이 있었다. 수업을 함께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책상 배치도 자유롭게 하고, 몇 명씩 무리지어서 둘러앉는 방식이었다. 원래는 그 여자애들과 함께 앉았었지만 갈라선 후로는 먼 곳에 앉았는데, 그때 같이 앉은게 내 반 남자아이들 셋이었다. 정확히는 넷이었는데, 한 명은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다. 내가 글로 표현해보려고 한 것은 그 중 한 명이다.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도, 걔의 눈 색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외국 매체에서 가끔 나오는 식상한 클리셰가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자신의 눈 색상이 뭐냐고 물어본다. 자신의 몸만 보고 접근한 건지, 정말 관심이 있는지 분별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런데 나도 매일 같이 앉고, 나름대로 특별했던 친구의 눈 색상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봐서, 누군가 답을 틀리게 말한다고 뭐라 하지는 못하겠다.
물론, 남자친구도 아니고 친구의 얼굴 특징을 잘 기억 못하는 것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같이 앉았던 그 셋(또는 넷) 중에서 걔는 사실상 친구가 아니었다.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지도 못했고, 내가 여자애들과 따로 앉기 위해서 걔와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일부러 친구를 했을법한 아이는 아니었다. 참고로 나는 항상, 친구인지 그 이상인지는 첫눈에 결정된다고 생각해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왔다. 그 애는 애초에 친구 이상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갑자기 친구관계 속으로 몰아넣어진 셈이었다. 물론 눈 색상은 기억나지 않는다.
본편을 쓰려던 계획은 아니었으니 이만하고...일기, 그러니까 [제이미의 일상기록] 또는 [t.m.i.]에 쓸 법한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둘 중 어느 시리즈로 들어갈지가 결정될 것이다.

일단 일기 대문 소환
나는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다. 받을만한 일 중에서는 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이 좀 큰 편이다. 좀 겸손하게 교정 교열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오타 같은 것을 찾는 일을 상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일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픽션의 경우 편집적인 '제안'을 하지만, 논 픽션을 선호하는 편이다.
암튼, 왜 자서전이 큰 일이냐 하면, 나름대로 자기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걸 내기 때문이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당연히 해외 인물들만 해당되는 얘기다. 내가 한글로 된 책을 작업하는 일은 없으니까. (물론 실제 지인들이 부탁해서 하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
간혹 가다가 야구선수나 뭐 요리사, 배우 등이 책을 냈는데, 거기서 (가령 셰익스피어나 라틴 문구를 인용하는 등) 생각보다 박식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줘서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내가(또는 그 누구라도) 알 만한 인사의 의뢰를 받더라도 절대 비밀을 지킨다. 사적으로는 말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일단 나 자체가 필명을 쓰기도 하는데, 모국어가 따로 있다는 것과 연령대 등등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말 안할 때 모르는 것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지. (물론 나와 직접 닿는 관계자는 알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끝난 작업이 있다. 책으로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하여간 그 인물은 90년대에 나온 아래 TV광고를 상기시킨다. 물론 당사자와 이 광고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아챌만한 관계는 없다.
95년도에 나온 리바이스 진 광고그럼, 자주 쓸 일이 없길 바라며 [The Full Motley]의 첫 회차를 이만 줄인다.
For @sndbox
This is the first record of my personal notes for future posts. It serves to notify the readers of some of the things to 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