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다. 이젠 이곳의 날씨도 꽤 선선해져서 아침저녁으로는 산책도 가능하다. 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34도니까 사실 가을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여름 날씨에 가깝지만, 그래도 10월 중순이니까 가을이라고 우겨보자.
청소를 좋아하지 않고 컴퓨터 바탕화면도 엉망으로 쓰는 나이지만, 이상하게도 휴대폰만큼은 깔끔하게 정렬하는 편이다. 그래서 휴대폰 아이콘은 용도에 따라 다른 화면에 있으며, 모두 무지개색->무채색 순으로 정렬되어있다. 그 정리벽은 음악에서도 유효한데, 클래식 음악과 재즈의 플레이리스트는 따로 존재하며, 특히 클래식 음악의 경우 작곡가의 생년월일 순으로 음악을 정렬해두었다.
올해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손대지 않았다. 어차피 줄곧 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음악을 듣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원하는 음악만을 듣기 힘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카페에서 들을법한 재즈 모음 방송만을 듣고 있었는데, 가을이 되고 나니 뭔가 가을 기분을 내고 싶어졌다. 동시에 생각나는 음악이 토니 베넷 할아버지의 The Good Life인 것은, 딱히 이 음악이 가을에 어울려서라기보다는 취미로 재즈 보컬을 배웠던 해의 가을에 이 노래도 한번 다뤄서인 것 같다.
올해 첫째 고양이가 많이 아팠다. 스팀잇을 시작하면서 고양이 이야기를 쓸 마음은 없었는데, 올해 주 관심사가 고양이 거대 결장과 신부전증이었다 보니 어느새 집사일기도 20편이 넘었고, 비마이펫에도 고양이 관련 글을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마이펫과 마나마인에 같은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었지만, 아무래도 상도에 어긋나는 것 같아 조금 다른 글을 쓰고 있다.
7월 초, 크레아티닌 수치 4.7mg/dL로 신부전 3기말 판정을 받았을 때, 그간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은 게 너무 미안했고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여름 내내 고양이 신부전에 대해 공부하고, 이곳에 팔지 않는 약과 신부전용 음식을 해외에서 사들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첫째 고양이를 돌봤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손상된 신장은 되돌릴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첫째의 상태가 날로 좋아졌다. 최근의 검사에서는 첫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2.1mg/dL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병원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게다가 지난 두 달간은 수액 한 번 맞추지 않았기에 더욱 이 상황이 놀랍기만 하다. 3월부터 2~3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검진을 다니던 첫째였는데, 지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예약은 내년 1월로 잡자고 하셨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그리고 첫째 둘째 고양이의 도움을 받아 이뤄낸 결과라 뿌듯하다.
받 뻗을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첫째 고양이의 상태가 좋아지고 난 후 힘든 여름동안 마음대로 아프지 못했던 나와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다. 좋아진 날씨와 더불어 운동을 시작한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한데, 원래는 날 못믿어서 운동 일지를 쓰려 했지만,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라 혼자만의 핑계로 운동을 빠질 수 없다보니 주중에 매일같이 6~7km씩 걷고 있어 따로 일지를 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남편도 회복되고 있어, 이번 주말엔 드디어 해변에 가기로 했다. 이곳의 해변은 여느 남국의 휴양지처럼 아름다워 지금처럼 날씨가 괜찮을 땐 매 주말마다 가곤 하지만, 이곳의 바다는 보기에는 예뻐도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늦가을, 겨울의 동해 바다와는 달라 가끔은 바람이 많이 부는 한국의 바다가 그리워진다.
지금까지 서른 번 정도 이사한 나는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망설이곤 한다. 그나마 태어나고 약 14년간 살았던 부산이 가장 고향에 가깝지만,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인해 연락하는 친구는 딱 한 명 남았고, 그마저도 미국에 살고 있어 고향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고향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게다가 내가 좋아했던 풍경마다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웨스틴 조선에는 오킴스라는 술집이 있다. 부모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에는 밝은 스포츠 바였기에 부모님이 그곳으로 데이트 가실 때면 눈치 없이 따라붙곤 했다. 아빠에게 포켓볼을 배운 곳도, 테이블 축구를 처음 접한 것도 그곳이었기에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는데 몇 해 전 방문해보니 특색 없는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 차라리 추억으로 남겨둘 걸 싶었다.
자주 외식 갔던 곳 중에는 "언덕 위의 집"이라는 레스토랑도 있었다. 아직도 달맞이 고개에서 영업하는 곳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90년대 초였던 당시엔 나름 핫 플레이스였을 것도 같다. 통나무로 지어진 그곳에선 피자, 파스타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곳의 음식보다는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을 좋아했다. 당시의 해운대 바닷가는 지금보다 백사장이 넓었고 동백섬 뒤는 깜깜한 바다였으며, 파라다이스, 하얏트 호텔(현. 노보텔), 글로리 콘도를 제외하고는 높은 건물이 없었다. 또한 웨스틴 조선부터 미포에 이르기까지의 백사장 끝에는 주황색 포장마차가 한 줄로 늘어져있었기에, 은은한 달빛에 일렁이는 까만 바다와 한 알 한 알 진주 목걸이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포장마차를 보고 있노라면 보석을 선물 받는 기분이 들곤 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달님을 보러 바닷가로 향했다. 달맞이 고개라는 이름만큼 달과 함께 바라보는 나지막한 언덕이 좋았는데, 지금은 주공 아파트를 허물고 높게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위압감이 느껴진다. 그 위압감은 그곳뿐 아니라 엘시티를 비롯한 고층 아파트들도 한몫하는데, 안개가 건물에 막혀버린 날에는 초고층만 보여 마치 공중에 떠있는 유령도시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릴 때 심시티를 할 때면 산과 나무는 무시하고 무조건 고층 건물이 가득 들어찬 도시를 짓곤 했는데, 내 어린 날의 추억이 같은 이유로 사라질 줄은 몰랐다. 요즘은 딱히 답답한 것도 없지만, 가을을 타는 건가? 쉴 새 없이 입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데, 막상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가을이 맞나 보다.
이전 글 : 나의 시선
다음 글 : Days of Wine and Roses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CrunchCup - The World's Greatest Portable Cereal Cup
CrunchCup The World's Greatest Portable Cereal Cup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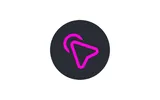
This posting was written via
dclick the Ads platform based on Steem Blockchain.
